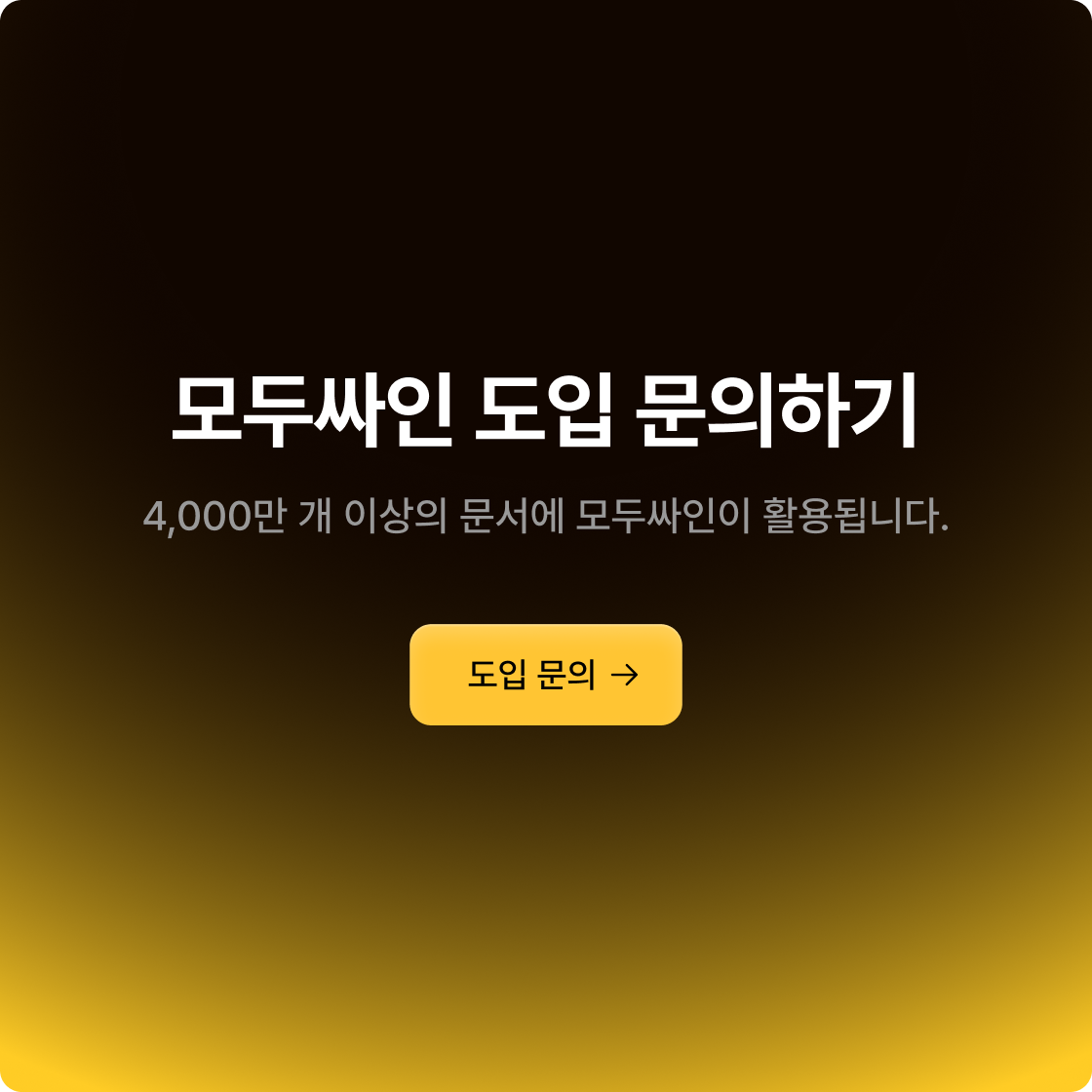“카카오・야놀자・대웅제약・한국맥도날드 등이 고객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비스를 통해 서명한 문서가 230만건이 넘어요.”
모두싸인은 클라우드 기반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회사다. 계약 당사자끼리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근로·용역·부동산·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하게 돕는다. 서명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한다. 또 도장이 필요하다면 디지털 도장을 바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공인인증서를 깔거나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이 서비스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법대생 출신 이영준(32) 대표다.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달라.
“부산대 법대를 나왔다. 원래 행정고시를 준비했다. 공부하다가 문득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초에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법대에 들어갔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한 선배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흥미를 느끼고 적성에도 맞는 일을 하고 싶었다. 2013년 4년 만에 고시 공부를 접고 IT 개발 쪽으로 진로를 바꿨다.
학교에서 ‘앱티브’라는 개발 동아리를 만들고 여러 앱을 제작했다. 동아리 활동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동아리 회원 중 나 포함 법학과 출신 2명, 시각디자인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출신 각 1명이 모여 2015년 12월 로아팩토리(현 모두싸인)를 차렸다.”
-모두싸인은 어떤 회사인가.
“IT 기반 법률 스타트업이다.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창업했다. 법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법률 시장은 폐쇄적인 편이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막막하지 않나. 법률사무소는 많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심리적 장벽은 높다.
첫 창업 아이템은 ‘인투로’라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였다. 고객에게 어떤 변호사가 어느 분야 전문가인지, 수임료 수준과 평판은 어떤지 등을 알렸다. 하지만 수익 모델이 문제였다. 우리나라에선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게 불법이다. 광고를 유치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회사를 만든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봤다. 또 수요가 있어도 규제나 시장 환경 때문에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다. 다른 아이템을 찾다가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를 기획했다.”

-전자계약 체결 과정을 알려달라.
“어떤 계약이든 서명요청자가 필요하다. 서명요청자는 쉽게 말해 계약 중재자다. 서명요청자가 계약서 문서 파일을 모두싸인 앱이나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러고 나서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서명할 위치 등을 정한다. 필요하다면 서명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다. 계약 당사자의 연락처를 적으면 이들에게 계약서 문서 파일이 담긴 링크가 간다. 링크를 누르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따로 앱·프로그램·액티브 엑스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모두싸인 회원이 아니라도 서명이 가능하다.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서명한다.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움직여 바로 서명할 수 있다. 도장이 필요하다면 디지털 막도장을 제공한다. 막도장이란 임시로 만들어 쓰는 도장이다. 실제로 이용하는 도장과 달라도 계약에 지장은 없다. 원한다면 법인 도장도 전자계약에 쓸 수 있다. 도장을 흰 종이에 찍은 뒤 카메라로 촬영해 올리면 날인이 가능하다. 서명이 끝나면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서 완성본이 날아간다. 계약서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우리는 건별로 서비스 대금을 받는다. 또 월 요금제도 운용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어느 정도인가.
“건별 이용권은 1장에 3300원이다. 10장을 사면 2장을, 100장을 사면 30장을 더 준다. 월 요금제는 한 달에 계약을 5건 이상 하는 고객이 주로 쓴다. 9900원, 2만7500원짜리 요금제가 있다.”

-사업 초기 고객한테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모두싸인을 통한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못 믿는 분이 많았다. 전자계약은 2% 부족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다. 또 보안 문제로 고민하는 고객도 있었다. 서버가 해킹당해 계약서 내용이 바깥에 알려지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가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라서 중요한 계약을 맡기기 힘들다고 본 것 같다. 그런데 일단 서비스를 이용해봐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존 계약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먼저 찾아갔다. 예를 들어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쓸 때는 가맹점주와 본사 관계자가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 원래 이들은 등기우편이나 퀵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약서를 주고받았다. 우리는 ‘그럴 바에 모두싸인을 통해 전자계약을 하라’고 했다. 전자계약에 낯선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입소문을 타고 고객이 점점 늘었다. 카카오 구매팀에서 모두싸인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규모가 큰 회사에서도 우리를 찾기 시작했다.
본사가 부산이라고 무시당한 적도 많았다. 창업 초기였다. 한 회사 부장이 미팅 때 한 시간 동안 일 얘기는 안 하고 부산 광안리 얘기만 하더라. 또 나이가 젊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 또 팀장 직함을 달고 영업을 했다. 대표이자 영업팀장이었다. 이런 전략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은 최대한 피하려 했다.”
jobsN / 2019.08.21